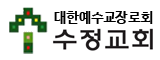감동편지
엄마의 희생은 당연한걸까?
몇 년 전 집에서 원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리기에 받아보니 그맘때 초등 고학년이던 딸이었다.
“엄마. 선생님이 지난 학기 교과서를 전부 집에 가져가라고 하셔서 짐을 쌌는데 너무 무거워요. 학교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나는 아이가 웬만큼 크고 나서는 학교에 드나들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 시간을 놓치면 좀처럼 다시 집중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무렵에도 아무리 잠깐이라도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 그날 일은 아예 못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나이쯤이면 굳이 부모가 나서지 않아도 자기 일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였다. 밖을 내다보니 마침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우산에 무거운 책 보따리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무리겠다 싶었다. 나는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겉옷을 챙겨 입고 학교로 나섰다.
그런데 딸은 학교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집 쪽으로 한 참 걸어오고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나와 조우한 딸은 제가 불러놓고도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반겼다. 마치 진짜로 내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아이의 짐을 받아들고 걷는 나를 향해 딸이 연신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마치 지나가던 행인에게 호의를 빚진 것처럼 고마워하는 딸의 모습에 나는 좀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약간의 죄책감도 느꼈다. 평소 엄마가 얼마나 냉정하게 느껴졌으면 이런 정도의 일로 저렇게 고마워할까.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고 그런 생각은 이내 지워졌다. 짐을 덜고 우산을 나눠 쓰며 걷고 있는 딸은 밝게 웃고 있었다. 아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평소에 나는 아이에게 엄마에게도 나름의 삶이 있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날 아이는 내가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마중 나갔다는 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아이의 책가방을 들어주러 학교로 마중 나가는 엄마를 둔 아이들은 느끼지 못할 종류의 감정을 아이는 느끼고 있었다.
나는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 지나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희생의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의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도 말이다.
아이가 조금씩 제 생각을 가지고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쯤 엄마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과 남편에게 쏟아 붓는데, 그게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다.
위장약을 처방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친구와 마주친 적이 있다. 친구는 주말에 김장을 하다가 몸살이 들었고, 그래서 병가까지 냈다고 했다. 그런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그 친구 옆에 장을 본 짐이 있었다. 친구는 김장하고 남겨놓은 배추 속으로 보쌈을 해먹으려고 고기를 샀다고 했다. 아프면 쉬면서 자신을 돌볼 것이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보쌈이라면 ‘환장’을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해줘야지.”
이런 말을 덧붙이는 그녀에게 나는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희생이 일종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다. 문제는 그쯤 되면 상대방도 받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물들이는 악은 언제나 불행한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인 셈 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불행해지니 말이다.
아이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뭔가가 삐걱거릴 때 멀리 떨어져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내 자신이 아닌 그들을 통해 행복감이나 대리만족 따위를 느껴보려고 하는 내가 있었다. 행복의 중심 축이 내가 아닐 때 서로가 불행해지더란 말이다. 자꾸만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다는 건 씁쓸한 역설이다.
어머니들의 전매특허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로 시작되는 각종 슬픔의 대서사시가 그 증거다. 따라서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걸 제일 우선순위에 놓기로 했다. 가족들이 장난으로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진지하게 그러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 대신 줄 때 기분이 좋아져서 가족들에게 선물이나 봉사를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니까 친구들을 기도 한다. 내가 행복해져서 후원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행복해지다 보면 아주 나이가 많아졌을 때 저절로 ‘세상의 빛’이 되어 있지 않을까?
– 남인숙 에세이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 중에서